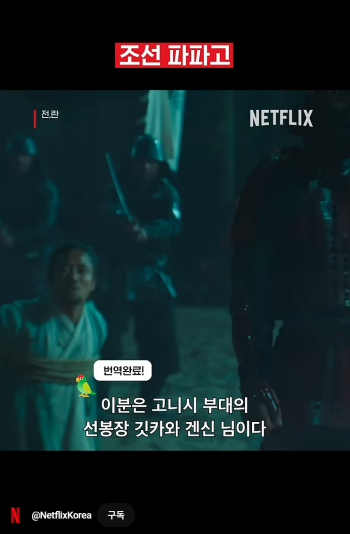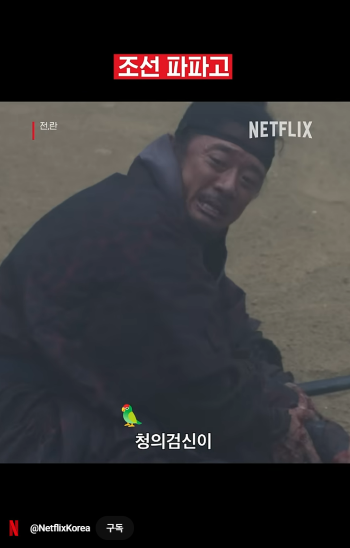1. 들어가며
2024년 10월 2일, 박찬욱 감독이 제작 및 각본을 맡은 것으로 개봉 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은 액션 사극 영화 ‘전, 란’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대중을 상대로 첫 선을 보였다. 필자는 해당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과분하게도 역사 관련 자문 담당이라는 역할을 맡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다. 그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제작진을 상대로 자문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추후 해당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정식 공개될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키워나가게 되었다.
이후 해당 작품을 직접 관람하면서 필자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구성상 제작진 측에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던 그대로 진행이 된 것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문을 통해 지적받은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필자조차 상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에 경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전, 란’이라는 작품의 역사적 고증 자체를 따지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해당 작품에서 시도한 묘사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지점을 중심으로 그것이 실제 역사상은 물론 역사학자의 연구에 있어서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지에 대한 소회를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언어 관련 ‘중간자들’과 미디어 속의 묘사
‘전, 란’이 개봉한 이후 해당 작품에서 비록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상당히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부분으로 필자 역시 꽤나 인상깊게 보았던 묘사가 하나 있었다. 바로 작중 주요 악역 중 하나로 등장하는 ‘깃카와 겐신’이라는 일본 장수를 따라다니며 그의 일본어를 우리말로 통역하고 다른 등장인물들의 우리말을 일본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맡은 ‘소이치로’라는 조선인 순왜(順倭) 캐릭터다. 통상적으로 사극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된 인물 간의 의사소통을 묘사할 경우, 비교적 최근까지도 해당 미디어를 제작 또는 시청하는 국가의 언어를 기준으로 삼아 두 인물이 모두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묘사하거나 어느 한 쪽 인물이 상대방이 구사하는 언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묘사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림 1. 조선파파고 '소이치로'
출처: Netflix Korea 유튜브
제한된 페이지 또는 러닝타임 안에 스토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인데, 그런 와중에 심지어 자기 신체가 절단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일본 장수를 위해 기어코 통역을 이어나가는 기염을 토하는 ‘소이치로’와 같은 ‘중간자’의 존재는 분명 대중에게 상당히 이례적인 캐릭터로 다가왔을 것이다. 필자가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아 그의 통역이 얼마나 원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대중들이 그 캐릭터에게 붙여준 ‘조선 파파고’라는 별명은 그 번역의 신속성 및 적확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해당 작품을 시청하던 중 이 캐릭터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 필자는 과거 자문 과정에서 제작진으로부터 ‘주인공과 일본 장수 캐릭터가 대결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실제 전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통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는가’ 정도를 골자로 하는 문의를 받았던 것이 다시금 떠올랐다. 조선시대의 통역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역관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역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중국어를 관장하는 한학(漢學) 역관, 일본어를 관장하는 왜학(倭學) 역관, 몽골어를 관장하는 몽학(蒙學) 역관, 여진어/만주어를 관장하는 여진학(女眞學)/청학(淸學) 역관으로 구분되었다는 점, 외국으로의 사신 행차가 있을 경우 통사(通事)라는 직임을 맡아 통역 등 각종 실무를 처리했고 외국의 사신이 방문할 경우에도 통역을 비롯해 사신단 일행과의 다양한 접촉을 담당했다는 점, 이들 외에도 일본인과 여진인/만주인들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이었던 지역에 살면서 일종의 생활 외국어에 익숙한 현지 주민을 임명해 활용하는 향통사(鄕通事) 제도가 있었다는 점 정도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제작진의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기에, 필자는 법전 등의 규정을 떠나서 실제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통역의 모습으로 어떤 것들을 참고용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다.
물론 조선을 비롯해 한반도에 존재했던 수많은 정치체들은 그만큼 다양한 주변 정치체들과 전쟁과 외교를 필두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접촉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중간자들’이 활약했다는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시대만 살펴보더라도 해수(海壽)·정동(鄭同) 등의 조선 출신 명(明) 환관(宦官)들과 정명수(鄭命壽)·한거원(韓巨源) 등 조선 출신 청 통관(通官)들이 ‘중간자들’로써 각각 조선의 대명(對明)·대청(對淸) 관계에서 한동안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대일(對日) 관계에서도 조선 측 사료에서는 다치바나 도모마사(橘智正)라고 등장하는 이데 야로쿠자에몬(井手彌六左衛門/井出彌六左衛門)처럼 교섭 실무를 맡은 ‘중간자들’의 존재가 여럿 확인된다.
가장 긴박한 형태의 접촉이라고 할 수 있을 전쟁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당장 임진전쟁(壬辰戰爭) 시기만 하더라도 조선과 명, 일본 삼국이 모두 얽혀있던 강화 교섭의 진행 과정에서 최전선에 있었던 실무자 중 하나인 심유경(沈惟敬)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정묘호란(丁卯胡亂) 시점에도 조선과 후금(後金) 간의 교섭 전면에 나서서 최종적으로 정묘맹약(丁卯盟約)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한인(漢人) 출신 유흥조(劉興祚)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자들’조차 전쟁 중에 진행되는 교섭과 타협이라는 시점에서의 활동을 뛰어넘어 아예 생사를 오가는 전투의 한복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는 현대인의 시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사료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결국 해당 자문 요청에 대해서는 필자도 한 동작 한 동작에 목숨이 걸려있는 전투 상황에서 과연 통역이 붙어야 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지, 그리고 설령 통역이 붙어있었다 하더라도 일전을 벌이는 와중에 그 통역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한채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3. 나가며
이처럼 ‘주인공과 일본 장수 캐릭터 간의 대결 과정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일일이 통역해주는 캐릭터’의 존재는 사실상 고증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전, 란’에서 이러한 설정이 좋은 의미로든 싫은 의미로든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깨알 같은 포인트 중 하나가 된 것은 그 고증 문제를 떠나서 역사를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작품은 죽음이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까지 통역이라는 직무에 지독하리만치 충실하게 임하는 캐릭터라는 만화적 설정을 가미함으로써, 주인공과 일본 장수 캐릭터 간의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의 진의를 마주하면서도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메워지지 않는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구도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정여립(鄭汝立)의 대동계(大同契) 관련 묘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범동이라는 특정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조직의 이름을 따오는 묘사를 제시함으로써 ‘대동’·‘범동(凡同)’이라는 이상적 개념어를 수미상관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전, 란’과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작품은 비단 문자 그대로의 언어뿐만 아니라 검술과 같은 각종 비언어적 ‘언어’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어의 단절이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전, 란’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전술했듯 수미상관 구조로 제시된 작중의 이상향이나 최종장에서 묘사된 주인공들 간의 상호 이해 내지 화해를 더욱 인상깊게 받아들이게끔 만들려는 구조로 판단된다.
하물며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의 언어와 통역의 문제는 결코 이 작품이 묘사하는 것처럼 깔끔하고 완벽한 외형조차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당장 조선만 하더라도 이러한 언어와 통역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마주한 채로 주변 정치체를 상대하면서 인식상의 간극에 직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를 감안하면 조선이 문서와 사신의 교환을 통해 외부와 소통했던 각종 사안의 추이 및 결과를 분석할 때, 연구자는 끊임없이 언어와 통역의 문제에 직면하고 그 대응에 고심해야 했을 조선이 과연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대처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와 같은 의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