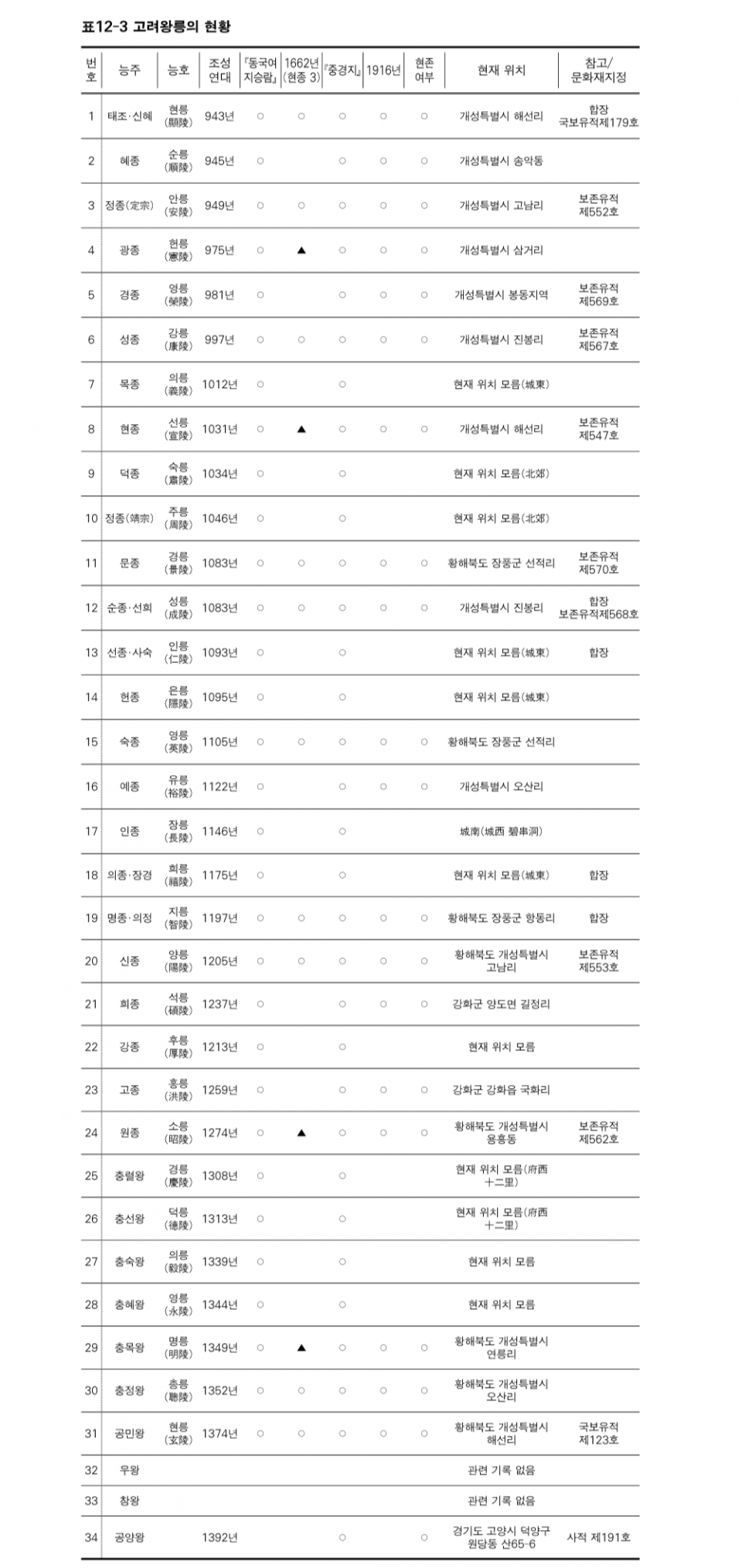웹진기사
|
웹진기사
기획연재
[기획연재] 섬에서 만나는 고려사 ⑥_박종진 작성자 한국역사연구회 BoardLang.text_date 2025.10.02 BoardLang.text_hits 27 |
|||||||||||||||||||||||||||||||||||||||||||||||||||||||||||||
|
웹진 '역사랑' 2025년 9월(통권 67호)
[기획연재] 섬에서 만나는 고려사 ⑥:강화도의 고려시기 능묘(陵墓)
|
|||||||||||||||||||||||||||||||||||||||||||||||||||||||||||||
| 능호 | 능주 | 위치 | 문화재 지정 | 발굴 |
|---|---|---|---|---|
| 홍릉(洪陵) | 고종(高宗) | 강화읍 국화리 | 사적 | |
| 석릉(碩陵) | 희종(熙宗) | 양도면 길정리 | 사적 | 2001년, 국립문화재연구소 |
| 곤릉(坤陵) | 강종(康宗) 비(妃) 원덕태후(元德太后) 유씨(柳氏) | 양도면 길정리 | 사적 |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
| 가릉(嘉陵) | 원종(元宗) 비 순경태후(順敬太后) 김씨 | 양도면 능내리 | 사적 |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
| 능내리(陵內里) 석실분 | 양도면 능내리 | 인천광역시 기념물 | 2006년, 국립문화재연구소 | |
| 인산리(仁山里) 석실분 | 양도면 인산리 | 인천광역시 기념물 | ||
| 연리(烟里) 석실분 | 선원면 연리 |
표 1. 강화도의 석실분(石室墳)
- 홍릉(洪陵)
고려 23대 왕인 고종(1192∼1259)의 능으로 고려산 남쪽 기슭(강화읍 국화리 산180번지)에 있다. 고종은 강종(康宗)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원덕태후(元德太后) 유씨(柳氏)이다. 고종은 1192년(명종 22) 정월에 태어났으며 1212년(강종 1)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1213년 즉위하였고, 1232년(고종 19)에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며, 1259년에 68세로 사망하여 홍릉에 안장되었다. 홍릉의 능역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35m, 동서너비 17.5m이며,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4단으로 보기도 한다.) 현재 1단에는 봉분이 있고, 봉분 뒤에는 사성(莎城)이 있다. 2단(전체를 4단으로 볼 경우 3단)에는 2기씩 마주보며 서 있는 석인상 4기, 상석, 혼유석, 묘표석이 있다. 묘표석은 1867년(고종 4)에 세운 것이고, 상석과 혼유석은 근래에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동쪽 석인상 뒤에는 홍릉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난간석 4개를 모아 놓았다.

그림 5. 홍릉. 사적.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고려산에 있는 홍릉의 봉분 모습이다.
- 석릉(碩陵)
고려 21대 왕인 희종(1181∼1237)의 능으로 진강산 동쪽 능선 남쪽 기슭(양도면 길정리 산 182)에 있다. 곤릉과 서북쪽 직선거리로 약 630m 떨어져 있다. 희종은 신종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정선태후(靖宣太后) 김씨(金氏)이다. 1181년(명종 11) 5월에 태어나 1200년(신종 3) 4월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1204년 1월에 왕위에 올랐다. 1211년 최충헌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폐위되어 강화현(江華縣)으로 옮겼다가 곧 자연도(紫鷰島)로 옮겼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1237년(고종 24) 8월 법천정사(法天精舍)에서 사망하자 낙진궁(樂眞宮)으로 빈소(殯所)를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의 문맥으로 보아서는 법천정사는 자연도, 낙진궁은 강화도로 추정되지만 법천정사와 낙진궁의 위치가 자연도(지금 영종도)인지 강화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석릉은 200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석릉의 능역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31m, 동서너비 20.5m이며,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단에는 봉분과 곡장이 있고, 곡장의 서쪽 전면에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높이 1.4m의 석인상 1기가 세워져 있다. 2단에는 묘표석과 석인상 1기가 있다. 높이 1.2m 가량의 석인상은 1단의 것과 달리 온전한 상태로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석릉은 발굴하기 전에 도굴된 상태였고, 발굴할 때 석실 내부에서 청자로 만든 접시·잔·대접, 은제품, 동전[해동통보海東通寶, 1107], 옥석유리제 구슬, 금박편 등을 수습하였다.
- 곤릉(坤陵)
곤릉은 강종(康宗)의 비(妃)이자 고종의 어머니인 원덕태후(元德太后) 유씨(柳氏)의 능으로 덕정산 남동쪽 기슭(양도면 길정리 산 75)에 있다. 이곳은 진강산의 동쪽이자 석릉의 동북쪽이다. 원덕태후는 신안후(信安侯) 왕성(王珹)의 딸로 강종 1년(1212)에 책봉되어 연덕궁주(延德宮主)가 되었다. 고종을 낳았고, 1239년(고종 26)에 사망하여 곤릉에 장사지내고 시호를 원덕태후라 하였다.
곤릉은 2007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곤릉의 능역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24m, 동서너비 19.6m이고,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에는 봉분이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봉분 주변에서 망주석, 난간석, 석인상과 석양으로 추정되는 석수, 하대석 등 능역시설의 부재들이 확인되었다. 2단에는 묘표석이 있다. 발굴을 통하여 아래 단에서 정자각의 정전(正殿)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정자각의 배전(拜殿)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석실 벽면에는 전체적으로 회칠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부분 박락되어 자세한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곤릉은 발굴하기 전에 도굴된 상태였고, 발굴할 때 석실의 묘도부에서 제례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사자삼족향로(靑磁獅子三足香爐)를 비롯한 각종 고급 청자류가 수습되었다. 또한 관고리와 찻물을 끓이는 그릇, 개원통보[開元通寶, 621] 등의 동전, 당초문은제도금장식대(唐草文銀製鍍金裝飾帶)와 나뭇잎 형상의 금동장식품, 동곳 등 장신구류도 출토되었다.
- 가릉(嘉陵)
가릉은 고려 24대 원종의 왕비인 순경태후(順敬太后) 김씨의 능으로 진강산 서남쪽(양도면 능내리)에 있다. 순경태후 김씨는 경주 사람으로 김약선(金若先)의 딸이다. 처음 경목현비(敬穆賢妃)로 책봉되었다가 1235년(고종 22) 원종이 태자(太子)가 되자 정순왕후(靜順王后)가 되었고, 충렬왕을 출산한 직후인 1236년에 사망하였다. 아들인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자 순경태후로 추존(追尊)되었다.
가릉은 2004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가릉의 능역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17.5m, 동서너비 11.3m이며,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에는 봉분이 있고, 봉분 북쪽의 동서편 모서리에는 석호(石虎)로 추정되는 석수 2기가 있다. 2단에는 석실(매장주체부)이 땅 위로 올라와 있고 동쪽에 묘표가 있다. 3단에는 높이 1.6m의 석인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중앙 남쪽에 판석을 깔은 남북길이 5.5m, 동서너비 4.8m 규모의 시설이 있다. 석실 벽면은 전체적으로 회칠하고 벽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나, 붉은색 안료가 일부 확인될 뿐 벽화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릉은 발굴 하기 전에 도굴된 상태였고, 발굴할 때 석실 내부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자류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원통보부터 정화통보[政和通寶, 1111∼1117]에 이르는 중국 동전을 비롯한 금속유물과 나비장식, 구슬, 호박장식 등의 옥석제 장식구 등이 출토되었다.
- 능내리(陵內里) 석실분
능내리 석실분은 묻힌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왕릉급 석실분이다. 능내리석실분은 진강산 서남쪽(양도면 능내리)에 있으며, 가릉에서 북동쪽으로 약 70m 떨어져 있다.
능내리석실분은 2006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강화도의 석실분 가운데 가장 큰 능내리 석실분의 능역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37m, 동서너비 21.6m이고,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 가운데 봉분이 있다. 발굴조사 당시 봉분 주변에는 석수와 난간석, 동자주(童子柱) 등의 석물들이 확인되었다. 석수의 경우 봉분의 북서, 북동편에서 1기씩 확인되었다. 2단에는 석축단 외에 별도의 시설물이 구축되지 않았고, 3단에는 건물지가 있고, 3단의 동, 서, 남, 북 네 지점에서는 진단구(鎭壇具)로 추정되는 도기호가 1점씩 출토되었고, 건물지 바닥 전면에는 전돌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건물지의 주변에서는 다량의 와전류가 출토되었다. 4단 석축의 전면 중앙에는 남북길이 3.2m. 동서너비 3.1m 규모의 출입시설이 있다. 석실 벽면은 전체적으로 회칠한 것으로 추정된다.
능내리 석실분도 발굴하기 전에 도굴된 상태였고, 발굴할 때 석실 내부에서 대접, 접시, 잔 등 다양한 청자류와 봉황문과 당초문이 타출된 은제도금장식과 동곳, 호박구슬 등의 장신구류, 개원통보 등의 동전이 출토되었다. 또한 석실과 능역 주변으로 다량의 와전류가 출토되었는데, 귀목문 막새와 취두 및 잡상 등의 특수기와도 다수 확인되었다.
- 인산리 석실분
인산리 고분도 묻힌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왕릉급 석실분이다. 인산리 석실분은 혈구산 남서쪽에 있는 퇴미산 남서쪽 기슭(양도면 인산리 산 71)에 있다. 묘역의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20m, 동서너비 11m이다. 묘역은 2∼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에는 석실이 있고, 하단부에는 2∼3단의 축단이 붕괴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축단은 붕괴되어 있어 자세한 양상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각 단을 대형의 석재로 약 1.6m 정도의 높이로 쌓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봉분은 남아 있지 않다. 문비석(門扉石)이 남쪽으로 벌어져 석실 내부가 일부 노출되어 있다.

그림 6. 인산리 석실분. 인천광역시 기념물.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인산리 석실분은 연리 석실분, 개골동 고려왕릉지와 함께 세조[태조의 아버지]와 태조 릉의 이장지나 재이장지로 추정되고 있다. 이 3곳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연리(烟里) 석실분
연리 고분도 묻힌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왕릉급 석실분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연리 석실분은 선원면 연리 신골 구릉(선원면 연리 산17)에 있다. 2003년 지표조사가 이루어질 때 석실의 개석 및 곡장으로 추정되는 할석렬이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연리 석실분은 봉분 일부가 유실되어 동서 길이 5.7m, 남북 너비 4.6m, 높이 1.3m의 타원형의 흙더미가 일부 남아 있고, 직경 2m 가량의 도굴갱이 함몰되어 있었다. 토사와 잡목 때문에 석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추정 곡장시설 역시 지표상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강도시기에 사망한 왕으로는 희종[1237년(고종 24) 사망]과 고종[1259년(고종 46) 사망]있고, 왕비로는 강종비 원덕태후[1239년(고종 26) 사망], 원종비 순경태후[1236년(고종 23) 사망], 희종의 후비 성평왕후[1247년(고종 34) 사망]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강화도에 묻혔다. 또 강화도로 천도할 때 태조의 능인 현릉과 태조의 아버지 세조(世祖)의 창릉도 강화도로 옮겼다. 1232년(고종 19)에 세조와 태조의 관[梓宮]을 새 도성으로 이장하였다는 기록과 1243년(고종 30) 8월에 세조와 태조를 강화 개골동(盖骨洞)으로 이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능주가 비정되지 않은 3개의 석실분이 성평왕후, 태조, 세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이상준은 먼저 순경태후의 능으로 비정된 가릉이 성평왕후의 소릉(紹陵)이고, 사망 연도가 빠르고 위계도 높았던 순경태후의 능은 그 가까이에 있는 능내리 석실분으로 보았다. 그것은 능내리 석실분이 먼저 축조되었고 석실과 관대의 크기 등 무덤 구조와 출토 유물로 보아 능내리 석실분의 위계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비슷한 추론으로 곤릉과 석릉도 바뀌어 비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능주가 비정되어 있지 않은 인산리 석실분, 연리 석실분, 개골동(盖骨洞) 고려왕릉지를 세조와 태조의 이장지와 재이장지로 추정하였다.[개골동 고려왕릉지에 대해서는 『강화의 문화유적』(2002, 인천광역시·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에서 위치와 간단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다.] 앞으로 이 3곳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3. 강화도의 고려 고분
강화도에는 왕릉급인 석실분 말고도 고려시기 고분(군)이 많이 있다. 2018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강화도에는 왕릉급인 석실분 7기와 묻힌 사람이 알려진 김취려묘·이규보묘·허유전묘를 포함하여 모두 29개의 고려시기의 고분(고분군)이 있다.
먼저 묻힌 사람이 알려진 김취려묘·이규보묘·허유전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겠다. 김취려묘(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는 진강산 서쪽(양도면 하일리 산70)에 있다. 김취려[金就礪, 1172(명종 2)∼1234(고종 21)]는 언양 출신으로 고려의 무신이다. 1216년(고종 3) 8월 이후 거란족[契丹遺種]이 고려에 침략했을 때 공을 세웠다. 강화 천도 후 문하시중이 되었고, 1234년(고종 21) 5월 강도(江都)에서 63세로 사망하였다.(그의 묘지명에는 진강현(鎭江縣) 대곡동(大谷洞) 서쪽 기슭에 장례 지냈다고 하였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동북쪽 구릉(울주군 언양읍 송래리 산15)에도 위열공 김취려의 묘가 있다.
이규보묘(인천광역시 기념물)는 덕정산의 동남쪽이자 진강산의 동쪽(길상면 길직리 산115)에 있다. 이규보[李奎報, 1168(의종 22)∼1241(고종 28)]는 여주 이씨로 많은 글을 남긴 문인이면서 재상의 지위까지 오른 고위 관리였다. 48세 때인 1215년 우정언(右正言) 지제고(知制誥)가 된 이후 최고 집권자 최우의 신임 속에서 최고 문한관의 길을 걸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강화도 북쪽에 있는 하음현의 객사에서 힘겨운 강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순조롭게 승진하여 종1품이라는 최고의 관직으로 은퇴하였고 은퇴한 지 4년 후인 1241년 6월 74세의 나이로 강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림 7. 이규보묘. 인천광역시 기념물.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허유전묘(인천광역시 기념물)는 덕정산 동쪽 능선(불은면 두운리 산297)에 있다. 허유전[許有全, 1243(고종 30)∼1323(충숙왕 10)]은 김해 사람으로 원간섭기에 문관으로 활동하였다. 1314년(충숙왕 1)에 가락군(駕洛君)에 봉해졌으며, 1321년(충숙왕 8) 수첨의찬성사(守僉議贊成事)에 임명된 후 관직에서 물러났다. 상왕이었던 충선왕이 원나라 티베트로 유배되어 있을 때 허유전은 1323년(충숙왕 10)에 81세의 고령으로 민지(閔漬) 등과 함께 원나라 대도(大都)에 머물면서 충선왕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323년(충숙왕 10)에 사망하였다. 1988년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유전묘의 형식은 수혈식 할석조 석곽묘이다. 발굴하기 전에 석곽은 도굴된 상태였다. 석곽 안에서 청자잔과 도기병 등의 도자류와 송원통보(宋元通寶) 등 중국 동전 이 출토되었고,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엉치뼈의 일부가 수습되기도 하였다.
| 묘호 | 묘주 | 위치 | 문화재 지정 | 참고 |
|---|---|---|---|---|
| 이규보 묘 | 이규보(李奎報) | 길상면 길직리 | 인천광역시 기념물 | |
| 허유전 묘 | 허유전(許有全) | 불은면 두운리 | 인천광역시 기념물 | |
| 김취려 묘 | 김취려(金就礪) | 양도면 하일리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도 김취려 묘가 있다. |
표 2. 강화도의 고려 관리묘
강화도에 있는 29개의 고려시기의 고분(고분군) 중 왕릉급인 석실분과 김취려묘·이규보묘·허유전묘를 제외한 19개의 고분(고분군)은 석곽묘가 많지만 토광묘와 화장묘도 있다. 도로를 건설하면서 발굴한 곳도 있고 지표조사만 한 곳도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없다. 고려시기 고분(고분군)은 강화읍을 포함하여 강화도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중에서 고분이 밀집된 곳으로 강화읍 대선리 고분군(169기), 고려산 남동쪽의 국화리 고분군(38기), 고려산 북동쪽의 하도리 고분군(71기), 진강산 남동쪽의 석릉주변 고분군(118기) 등이 있다. 강화도는 한 때 고려의 수도였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려시기 고분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8. 진강산 전경
진강산 기슭에는 왕릉 4기와 이규보 허유전묘를 비롯해서 고려 고분이 밀집된 곳이다.
----------
참고문헌
박종진, 2022 『고려왕조의 수도 개경』, 눌와
장경희, 2008 『고려왕릉』, 예맥
정해득, 2013 『조선 왕릉제도 연구』, 신구문화사
이상준, 2018 「강화 고려왕릉의 특징과 능주 추론」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
인천광역시·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강화의 문화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江華의 高麗古墳 지표조사보고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강화 고려고분분포 현황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한국중세고고학회·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2025 『고려강화도성 고고자료집2』
장경희, 2008 『고려왕릉』, 예맥
정해득, 2013 『조선 왕릉제도 연구』, 신구문화사
이상준, 2018 「강화 고려왕릉의 특징과 능주 추론」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
인천광역시·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강화의 문화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江華의 高麗古墳 지표조사보고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강화 고려고분분포 현황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한국중세고고학회·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2025 『고려강화도성 고고자료집2』
- BoardLang.text_prev_post
- [기획연재] 한양의 옛사람과 풍류 ⑥_김성희
- 2025.10.03
- BoardLang.text_next_post
- [기획연재] 마을에서 역사하기 ⑥_박수진
- 2025.10.02